숲 해설가로 활동하는 수필가
무뎌진 감흥 깨우는 묘사 탁월
평소 자신이 생활하던 공간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1년을 살아보면 기분이 어떨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사라져가는 마음 중 가장 큰 것이 호기심에 의한 감흥일 것이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이가 들었어도 호기심이 있다면, 아직 젊다는 얘기 아닐까.
마산문인협회 김영혜 수필가는 분명, 아직 젊은 문인임이 틀림없다. <그 숲에서의 일 년>은 천진난만하고 호기심 가득한 그의 모습을 오롯이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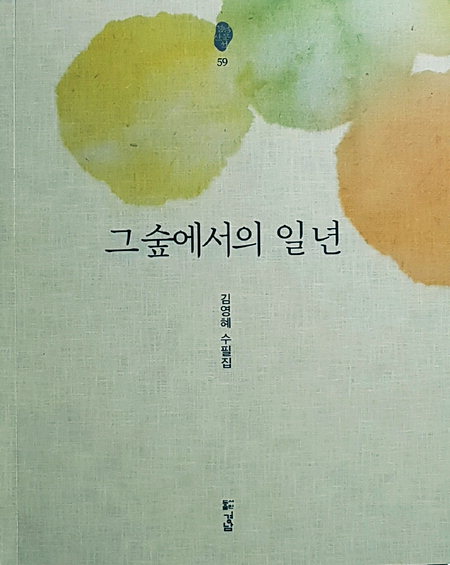
이 수필집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첫 번째 글 '이 숲에서의 일 년'에는 프리랜서 숲해설가로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 숲에서 네 계절을 보내게 되었다. 같은 숲에서 갔던 길을 다시 걷고, 어제 보았던 것들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이 숲에서는 어떤 생명들을 만나게 될까?"
그런 기대치와 호기심 때문이어서일까, 작가의 눈은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 '마이크로 코스모스'에 닿아 있다.
"봄비는 땅을 헤집고 흙을 쓸어내릴 만큼 세게 내리지 않는다. 가만가만 땅을 적시고 흙 알갱이 사이에 스며들어 아래로 내려간다. 겨우내 땅속에서 시린 바람을 피하던 작은 씨앗을 만난다. 잠든 씨앗을 흔들어 깨우지도 않는다."('봄비가 씨앗을 부르는 방법' 일부)
민달팽이와 노는 모습은 그저 천진난만한 아이나 다름없다.
"엄청나게 크지? 얼굴을 바짝 들이 대본다. UFO만큼 빠르지? 훌쩍 저편으로 건너 뛰어본다. 달팽이가 더듬이를 몇 번 꿈적댄다. 기껏 일 미터 남짓 공간에서 빠르면 얼마나 빠르고 크면 또 얼마나 크다고 이 난리인가 싶은 모양이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일부)
마지막 글 '그 숲에서의 일 년'에선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책장을 덮는 순간 한 편의 영화를 보았구나 싶다. 경남. 182쪽. 1만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