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창홍 시집〈도도새를 생각하는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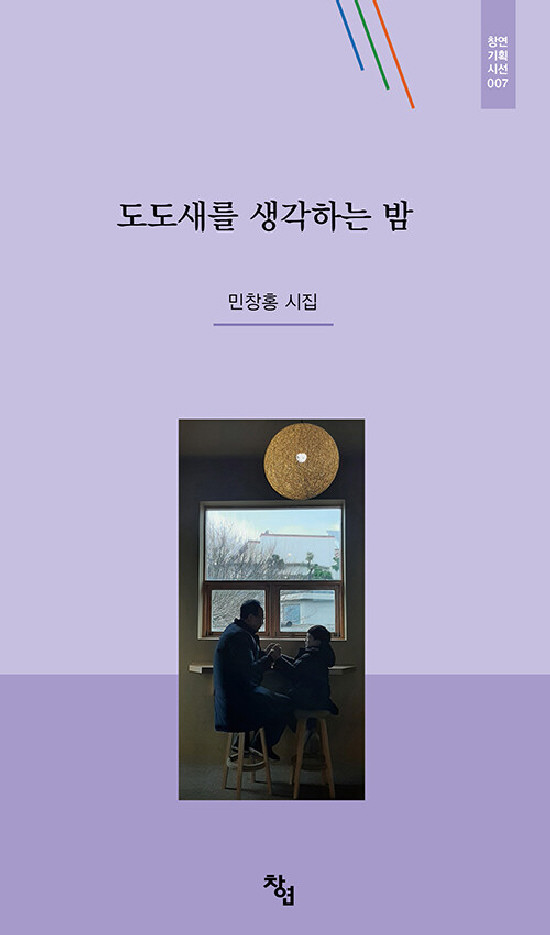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가 하고 생각하다가 의미 없음을 깨닫는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민창홍 시인의 시집 <도도새를 생각하는 밤>은 마치 '삶은 결국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선언처럼 읽힌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서 저마다 유모차의 행렬 구부정하게 기다린다 (중략) 오고 가는 자식들이 사다 놓은 간식들/ 경로당 마당 정자에 모이고 / 밤새 나눈 자식들 전화가 꽃을 피운다 (중략) 따라나서는 친구들 손사래 치고는 주머니의 것들 / 주섬주섬 유모차에 싣는다/ 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 지난밤에 아프다고 오지 않은 친구네로 가네" ('텃골 할머니' 중에서)
살아 있으니 사는 거다. 어쩌면 이게 삶의 본질인지도 모른다. 하여 그저 묵묵한 일상을 시로 옮겨 적는 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生)이 곧 시(詩)다.
"아흔이 되신 아버지의 전화다. 감이 열릴 때를 기다리다 지쳐서 늙은 감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단다. 아궁이로 향할 나무토막을 생각하다가 묘목을 심으리라 하신다. 언제 키워서 따시려고요? 남쪽 지방에는 단감나무가 많으니 사가지고 오라는 명이다. 묘목을 사러 이른 봄에 소답시장에 나간다. 북쪽에서도 잘 자라나요? 어린 묘목은 얼어 죽는다고 겁만 준다. 추위에 견딘 묘목은 어디서 사나요? 꽃을 흥정하던 노인이 온실 말고 노지에서 키운 거 사면 돼요. 객지로만 떠돌던 내가 단감나무 묘목을 구하러 시장을 돌고 돈다. 동해(凍害)를 입지 않는 단감을 위해 감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위해." ('단감나무 묘목' 전문)
/이서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