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출신·결혼해 일본 이주한 저자
"개인주의는 고립이나 단절 아냐
각자를 지키면서 함께 사는 방법"
더 건강한 공동체 위한 가치 역설
서른다섯 민지 씨는 '개인주의'를 철저하게 옹호한다.
저자 최민지는 자라면서 어른·친지·선배·주변인들에게서 수없이 받은 질문이 있다. '애 낳고도 개인주의가 가능하겠냐' '개인주의자도 결혼을 하냐'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회사 팀워크를 해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 짙은 의문들. 그는 책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로 대답한다.
온전한 개인이 결국 온전한 가족과 조직,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쳐 온 날들에 대한 기록을 생생하고도 유쾌하게 그린다.
"개인주의는 고립이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강하게 이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개인이 각자를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일은 어렵지도 불가능하지도 않다. 개인주의자가 모여 서로 동등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가족을 이루고, 이웃과 어우러져 '생각보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 보려 한다."(11쪽)
통영 강구안에서 성장기를 보낸 글쓴이는 경쟁보다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사는 방법을 배운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대학 졸업 후에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모두 올바르게 잘 살자는 '노나메기'를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시민단체와 협동조합에서 일했다. 지금은 일본 나고야에서 3인 2묘 가족을 꾸리고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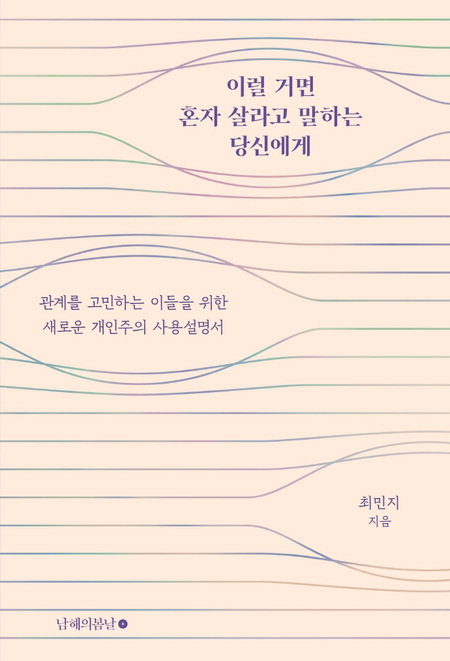
직장생활을 하던 때 선배가 그에게 물어온다. 일본 여행을 다녀왔느냐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 친구랑 외박하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미지 관리 좀 하라고. 개인적으로 올린 페이스북을 본 선배가 빼놓지 않고 '자기가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라는 끝맺음으로 충고한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혹은 따뜻하게 느끼도록 교육이 된 가족이라는 관념이 언제나 선은 아니다. '동생 같아서, 자식 같아서'라는 말은 묘하게 권위적인 느낌이 난다. 상대가 제멋대로 연장자의 위치를 취한 순간 관계도는 자연히 손위-손아래로 서열화되고, 아랫사람 된 입장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워진다."(45쪽)
일본 나고야 출신 남편도 개인주의자다. 서로 부모를 만나러 가면서 결혼은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일'이란 걸 느낀다.
남편의 부모도 개인주의자다. 그중에서도 시어머니는 1960년 일본 여성운동이 태동한 시기 영향력을 받으며 요즘으로 보면 알파걸처럼 살았다. 시아버지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고, 일가족 양립을 온전하게 영위했다. 철저히 개인주의자인 시어머니 덕분에 당위적인 안부 전화라는 건 주고받지 않는다. 대신 그가 육아와 일로 지쳐 보일 때 안부와 위로를 전하는 글귀가 담긴 엽서를 정성스럽게 가끔 보내올 뿐이다. 10여 분 거리 가까이 사는 시부모지만 각자를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서로 배려하고 지킨다.
책 곳곳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비추고 고민하는 흔적이 가득하다. 결혼 이주민이 된 그가 겪는 일들을 통해 한국에 사는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환기한다. 자신의 아이는 여전히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올림픽 때 너는 일본을 응원하는지 한국을 응원하는지 말이다.
"개인주의가 확대되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은 너무나도 납작했다. (중략) 그러나 개인의 연대로 쌓아 올린 공동체는 다르다. 개인이 주인 된 공동체 속에서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도 최대한 넓은 합의점을 찾아 나간다. 개인은 공동체를, 공동체는 개인을 보조한다."(270쪽)
직장 생활을 한 개인주의자, 결혼한 개인주의자, 아이 키우는 개인주의자. 가능하다.
272쪽. 남해의봄날. 1만 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