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 역〉 (김교환 지음)
어느 날 김교한 원로시인이 보낸 시집과 함께 자필 편지가 도착했다. 제법 흔들리긴 했지만, 곱고 단정한 글씨체를 통해 꼿꼿한 그의 성정을 얼핏 알 것도 같았다. 시집 뒤편 약력 중 중요한 경력에 일일이 줄을 쳐 강조를 하셨다. 한국문학상에서 대통령상까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다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문학 관련 협회 경력이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할 듯하다. 1928년생이니 만으로 아흔둘. 이 연세에 신작을 담은 시집이라니 차라리 이 사실이 지극히 놀랍다. 시집에서 시인은 가만히 자신이 걸어온 시조의 길을 뒤돌아보고 있었다.
시집에는 떨어지는 것들을 노래한 시조가 많은데, 그에게 추락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세월이다.
"지고 싶어 지는 꽃이/ 어디에 있겠는가/ 가신 봄 데려다 놓고/ 제 먼저 길 떠나니/ 바람도 어지러이 불어/ 상처만 내고 있다"('목련꽃 지는 날' 전문)
"기약 없이 지는 꽃잎/ 피는 동안 보는 거다// 알고 보면 크고 작은/ 흔적 하나 위해 산다// 언제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가는 걸음 오는 걸음"('흔적' 전문)
하지만,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는 것들이 있어 위로가 된다. 머리말에서 말한 '좀처럼 지울 수 없는 그림자'나 '큰 산의 거목, 장강의 속삭임' 같은 이미지와도 연결된다. "고향길 하나 되게/ 그대가 있어 가능했다/ 비 오고 바람 불어도/ 자국 놓고 오가는/ 언제나 그리운 노래가 울릴/ 광장은 기대가 크다"('그리운 역'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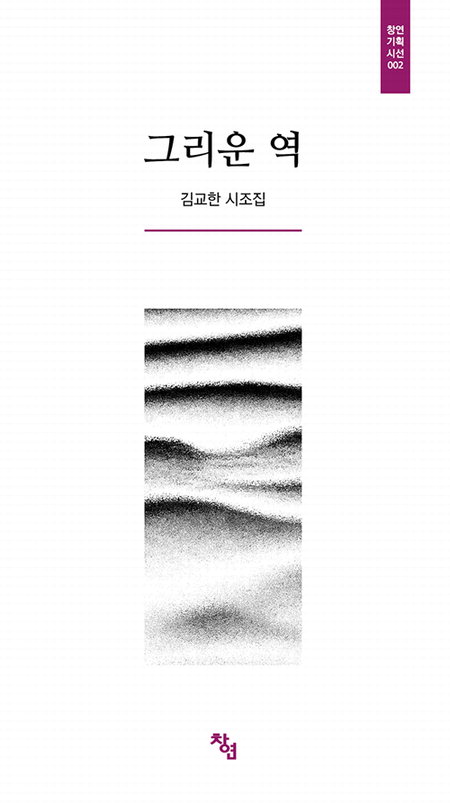
"기대고 싶은 둥지를 짓고 지친 걸음 망설이는가// 온갖 풍상 다 헤치고 시간의 대하 건너온// 우람한 이 원로 앞에서 길손은 길을 묻는가"('거목 앞에서' 중에서)
"불신의 거리조차 스스로 걸러내며/ 층층이 발 돋우어 철마다 커 온 분수/ 하늘에 허물을 벗고 빗질 홀로 하고 있다// 어느덧 가을을 맞아 군데군데 이끼 자국/ 기억의 동강 달고 수리먹은 품을 안고/ 세월을 놓치지 않는 거울 되어 서 있다"('세월 그 고목' 중에서)
그리고 뒤돌아보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내일이 움트고 있다. 하여, 그는 영원을 꿈꾸는 시인이다.
"아무 데나 깔고 앉을/ 그런 자리 이제 없다// 강물은 쉬지 않고/ 연이어 흘러가니// 지난날 빚은 상처도/ 치유의 손 놓지 말자// 어느 날 어디쯤에 꽃이 영글 그날 위해// 이 땅 딛고 경건하게/ 일을 위해 일해왔는가// 아쉬움 어찌 없겠나 마는/ 기다리는 내일이 있다"('꽃이 영글 그날 위해' 전문)
"무심코 놓아버린 강물은 서로 안고/ 무거운 굽이에서 다투어 빠져 나와/ 새로운 시야를 넓히면서 봇물 되어 너그럽다"('강물 앞에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