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편중 심화되는 사회 속 생존 몸부림
공동체 붕괴 예고한 파열음의 치유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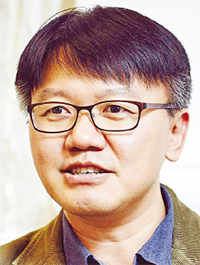
가상(암호)화폐, 일명 코인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올해에만 새로 가상화폐에 뛰어든 사람이 2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60%가 2030세대로 추정된단다. 그중 상당수가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쓰는) 수준의 투자란다. 희망 때문이란다.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다. 이 희망은 절망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성공담들이 조바심 나게 만든다. 막차라도 올라 타지 않으면 영영 낙오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코인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의 코인 열풍을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에 빗댄다. 뿌리 하나에 집 한 채 가격 이상으로 치솟던 튤립 가격은 1673년 2월 3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폭락했다. 특별한 이유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었다. 고수익을 열망하던 집단심리의 균형추가 바로 그날 불안감 쪽으로 기울었을 뿐이다. 불안감의 잠금장치가 풀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졌다. 물론 이런 비유에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실체가 있는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튤립 파동 같은 파국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17세기의 튤립과 21세기의 코인을 대하는 대중 심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네덜란드와 유럽이 튤립으로 몸살을 앓던 그때 조선 땅에선,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허생이란 인물이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었다(17세기 효종 때가 배경). 남산 아래 묵적골 오막살이집에서 책만 읽던 그는 아내의 원망을 듣고 일어나 부자 변 씨에게 돈 1만 냥을 대출해(레버리지) 안성의 과일, 제주의 말총을 매점매석하며(플랫폼 사업)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박지원은 그가 부자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지 않았다. 허생은 벌어들인 돈으로 수천 명 도둑떼를 설득해 각자 신붓감과 소 한 마리씩 안겨주며 무인도에서 새 삶을 살게 했다. 그는 또 남은 돈 50만 냥을 바다에 버렸다. 사회학자 이진경은 <파격의 고전>에서 허생 이야기가 상술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한다.
북미 대륙의 원주민 공동체에 '포틀래치(Potlatch)'라는 관습이 있었다. '증여 게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풍습에 따라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은 선물 외에 나머지 자기 재물도 대대적으로 소모하고 탕진했다. 집과 담요를 불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귀중품을 부수어 물속에 던져버리기도 한다. 왜 이런 과한 행동들을 했을까? 부의 편중이 심화되면 공동체가 결국 파괴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허생이 50만 냥을 바다에 버린 행동은 그 돈이 공동체에 일으킬 부작용을 예상한 예방책이었다.
코인 열풍은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 붕괴를 예고하는 파열음이기도 하다. 이 균열을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까? 포틀래치 정도는 아니어도 이제 부의 사회적 탕진(혹은 재분배)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자들의 소득과 재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세를 두 배 인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