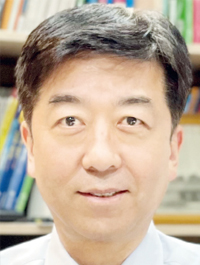
해마다 이맘때면 목월의 시 '윤사월'이 살몃 떠오른다. 자고나면 창틀이나 자가용 보닛 위에 노랗게 내려앉은 송홧가루 때문이기도 하다.
내 어릴 때는 송홧가루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 때는 1960~70년대라 산림녹화를 시작할 무렵이었고, 동네 주변의 야산은 민둥산이거나 지금은 흔한 소나무도 듬성듬성하였다. 그러니 송홧가루를 쉬이 볼 수가 없었다.
'윤사월'의 첫 구절 "송홧가루 날리는/외딴 봉우리/…"는 한동안 이상향의 동경 따위를 그린 관념적인 표현이란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알고 보면 아주 사실적인 묘사인데 말이다. 왜냐면 시인이 이 시를 쓸 적에도 방방곡곡 솔밭은 드물고 다만 외딴 멧부리, 다시 말해 나무꾼이나 관청의 벌목이 수월치 않은 가파르고 외진 산마루에서는 5월의 솔 꽃가루가 바람에 날렸을 테니 말이다. "윤사월 해 길다/꾀꼬리 울면/산지기 외딴 집/눈먼 처녀사/…"로 이어지는 이 시의 뒤 구절도 꽤 사실적이다. 꾀꼬리란 새도 아침부터 지저귀진 않고 낮이 긴 해거름 무렵 짝지어 군무를 즐기는 것을 내가 종종 보았기 때문이다. 산지기의 눈먼 딸도 그 시대상황에 맞는 설정이라 본다.
며칠 전, 선산을 에워싼 우거진 갓이 봉분을 나무그늘로 가리기에 장대 톱을 장만해 가지를 쳐냈다. 그때 잘린 소나무 가지가 와락 떨어질 때 함께 우수수 떨어지는 송홧가루의 양이 대단한 걸 보았다. 어릴 땐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당시 생솔가지가 우리 농가의 주된 땔감이었고 남벌이 불가피해 솔숲이 남아나지 못했으니 말이다. 온 동네사람들이 낫으로 쳐낸 솔가지로 나뭇짐을 해다 나르는 게 큰 일과였을 정도다.
솔은 송진 때문에 화력이 세다. 송진만큼 끈적끈적한 송충이를 잡던 기억도 새록새록 하다. 송진은 또 의약, 산업용 따위 쓰임새가 아주 많았으며 조선총독부에서 일본군의 군수품으로 충당키 위해 무더기로 탈취한 것으로 안다. 그 흔적이 지금도 잘 남은 데가 있다. 가야산 홍류동 계곡 홍송 군락지다. 오랜 수령의 장송 둥치에 빗살무늬 칼집을 총총히 내 송진을 추출하고 아문 생채기가 뚜렷하다. 손상된 나무가 하도 많아 세기조차 어려운데, 일제의 수탈은 심산유곡까지 파고 들었다.
송홧가루는 소나무 수꽃가루로 다른 나무의 암꽃까지 바람에 날려 보낸다. 이탈리아 작곡가 레스피기의 교향시 <로마의 소나무>는 로마에의 그리움과 향수를 담은 곡인데, 가만 들어보면 오월의 송홧가루가 온산에 조용히 피어오르는 느낌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