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생물학이 본업인 올림픽 선수 눈길
폭넓은 교양 갖춘 인재가 큰 성취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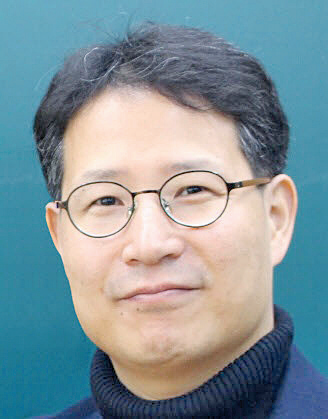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은 즐김의 미학을 선사한 신세대 선수들 얘기로 훈훈한 기억을 남겼다. 메달과 상관없이 코로나로 말미암은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고 지낸 듯하다. 올림픽 열기가 한창일 때 이색적인 올림픽 출전자를 소개한 기사가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본업이 과학기술 분야라는 점이었다.
여자 펜싱 금메달리스트 리 키퍼는 현재 미국 켄터키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 여자 사이클에서 금메달을 딴 안나 키센호퍼는 오스트리아 빈 공과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스페인 카탈루냐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스위스 로잔 연방공대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국제적(?)인 연구자다. 메달리스트는 아니지만, 여자 복싱 웰터급에 출전한 나딘 아페츠도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독일 베르멘대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던 시기에 취미로 복싱을 시작했고, 현재는 쾰른대학병원에서 신경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 분야는 노년기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뇌를 깊이 자극할 때의 효과에 관한 내용인데, 복싱선수가 파킨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니 연구 몰입도가 남다르긴 할 것도 같다.
모두 올림픽 출전을 준비하면서도 과학기술분야 본업을 병행했던 진정한 아마추어 선수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을 한 뒤 연구실로 출근했을 것이고 철저히 자기계발에 매진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축구부가 생각난다. 60여 명이 바글거리는 교실 맨 뒤에 가끔씩 들어와 잠만 자고 나가던 친구들이 있었다.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분노의 분필 샷을 날리면, 머리를 긁적이며 '축구부입니다'라고 말하고 자던 잠을 마저 자던 기억이 또렷하다.
외국 주요 대학들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연주 같은 활동을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인생의 여러 단면을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전인교육에 방점을 둔다는 의미다. 지덕체 균형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표로 삼기에 가능한 일일 것 같다. 운동이나 악기연주가 집중력을 길러주고 대인관계나 감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는 차고 넘친다. 같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폭넓은 교양을 갖춘 인재가 더 훌륭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총 88개의 메달을 휩쓸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가적 성취 이면에는 '88 꿈나무'를 육성하던 우리의 어두운 과거가 있다. 유망주 아이를 학대에 가까운 방식으로 편식시키는 영재 육성 방식 말이다. 다이빙 신동이라는 14세 금메달리스트는 인터뷰에서 간단한 중국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도 없고 기초 교육도 받지 못한 채 다이빙 기계이자 국가사회주의의 부품으로만 육성된 불쌍한 아이다.
지난여름 온라인 수업에서 "한국인 DNA에 예술성이 없다"는 말로 논란을 일으킨 바이올리니스트 주커만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일정부분 사실일지도 모른다. 진화생물학자 도킨스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모방 가능한 단위체로서 생물학적 유전단위 DNA에 대비되는 밈(Mem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감정의 울림이라는 예술 본질은 사라지고 현란하고 빠른 손재주에만 치중하는 엘리트 음악 교육처럼, 전공 지식 이외에 내실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양이 생략된 채 대학에서 찍어내는 연구개발 부품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이들을 육성하는 환경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