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일면들 일상 사물에 녹여
시인의 옆모습 비추는 듯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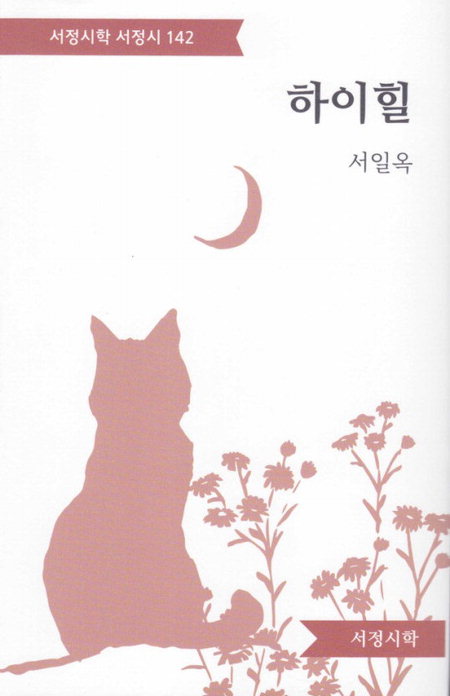
서일옥(69) 시조시인의 다섯 번째 시조집 <하이힐>을 가만히 읽다가 얼핏 한 사람의 생을 본 것도 같다. 교육현장에서 또 문단에서 제법 대단한 이력을 쌓아온 그지만, 이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삶의 일면들이 무심하게 놓인 사물들에 담겼다.
"꽉 다문 입술로/ 평생 재갈 물고 있다// 우두둑/ 관절들은/ 소리 없이 울지만// 절대로 놓을 수 없다// 깡마른 결기만은" ('빨래집게' 전문)
"하루치 노동을 말갛게 씻어낸 뒤// 지쳐버린 내가 싱크대 위에 누워 있다// 비로소 얻은 자유여// 목숨 같은 안식이여" ('고무장갑' 전문)
"내 삶을 대변해 온 정겨운 바이올린// 언제 어디서나 자존의 마지막 성// 속으론 비록 비어도// 너는 늘 의연하다" ('핸드백' 전문)
보통 시는 마지막 연에서 시를 시답게 만드는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하이힐>의 시들은 어쩐지 첫 번째 연에 자꾸 마음이 쓰인다. 무던한 풍경들 앞에서 주억거리는 시인의 옆모습을 들여다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다. 어쩌면 서일옥 시인이 시를 시작하는 방식 그 자체에 이미 시의 정취가 가득 담겨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구겨진 일상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눈 내리는 전나무길 자로 재듯 걸어보니/ 한순간 소리는 없고/ 온통 적막뿐이었다" ('내소사 설경' 중에서)
"저무는 한 생의 뒷모습에 목이 멘다/ 다시 올릴 깃발도 없는 침묵의 지붕위에/ 희미한 불빛 한 줄기 바람에 흔들린다" ('군산' 중에서)
"일상의 쉼표하나 여기 와서 찍는다/ 스치면 베일 듯 아슬한 순간들도/ 저물녘 노을에 젖는 등대 되어 오롯하다" ('슬도' 중에서)
가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햇살 좋은 테라스에 앉아 편안한 휴식을 만끽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생의 풍경들을 만나려고 시인은 오늘도 "또 걸어갈 것이다(시인의 말)."
서정시학. 119쪽. 1만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