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시신 마주하는 법의학자 저자
후회없는 생애 무엇일까 화두 성찰
'죽음'.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사건·사고 뉴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골 주제 중 하나가 죽음이다. 뉴스를 틀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사망 소식이 연일 매스컴을 타고 대중에 전해진다. 무겁고 낯설기까지 해 남의 일로만 여겨지는 죽음, 그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나는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한다.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가꿔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색한 책이다.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이른바 '서가명강 시리즈' 첫 번째 편으로, 20년간 1500여 건의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자이자 법의학 분야 권위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책을 펴냈다. 대학에서 '죽음의 과학적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양강의를 열어왔던 그가 더 많은 사람과 죽음에 관한 고민을 해보기 위해 죽음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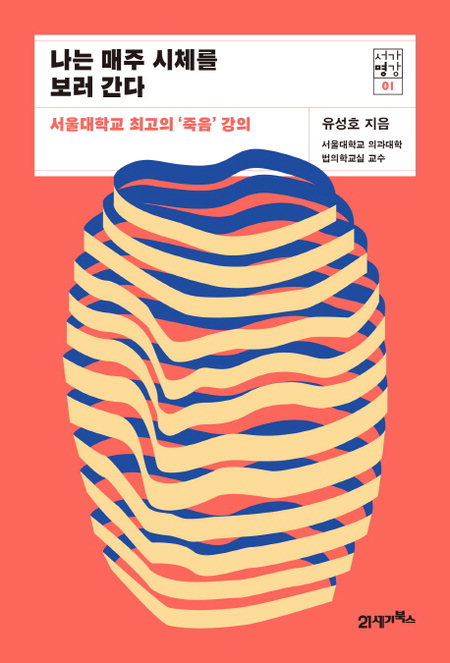
책은 법의학자 가방엔 누군가의 일생이 있다는 머리말로 시작한다. 매주 월요일 지은이는 시체를 조사하는 행위인 검시를 진행한다. 검시는 두 가지로 나뉜다. 검안과 부검이다. 두 방식으로 죽은 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는 게 그의 일이다. 지문과 치아, 유전자를 통한 객관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한 뒤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를 가려낸다. 자연사, 외인사한 시체를 포함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을 상대로도 타살 의혹 확인을 위한 부검을 한다. 여러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검시를 진행하는데, 매주 3~4구 정도의 시신을 부검한다.
그를 애타게 찾는 기관이 여럿 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이다.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 문제 때문에 법의학자를 찾아온다. 그의 가방에 담겨 있는 누군가의 죽음 기록이 법률적 측면에서 각 기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때로는 죄의 유무 판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범인 색출과 형량의 정도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저자의 표현대로 법의학자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지은이는 20년간 법의학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던 법의학자다. 그런 그에게도 죽음이 낯선 형태로 다가오는 건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 죽음을 비켜 갈 순 없다"고 말하는 지은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삶의 마지막 여정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여야만 현재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일상생활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으로 크게 다섯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그리고 자주 하는 것, 둘째는 죽기 전까지 자신이 진정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셋째는 그간 살아온 기록을 꼼꼼히 남겨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 넷째는 자신의 죽음을 처리하는 장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모으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것, 다섯째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은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평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일상 매순간이 갖는 눈부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 아닐까.
21세기북스 펴냄. 277쪽. 1만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