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최고 권위 상 받은 도예 작가
미술관서 떠올릴 만한 질문들 던져
예술의 가치·보는 시각 곱씹게 해
<미술관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을 위한 동시대 미술 안내서>라니. 매우 친절할 것 같은 책 제목과 달리 내용은 '제목이 잘못된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오하다.
저자는 제목에 낚였을 독자에게 미안했는지, 앞으로 펼쳐질 난해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에 앞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독자 분들이 이 책에서 꼭 챙겨 갔으면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예술을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예술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10쪽)
이 재치있고 진지한 저자는 영국 도예 작가 그레이슨 페리다. 영국 최고 권위 현대 미술상인 '터너 상'을 2003년 수상했고, 10년 뒤인 2013년에는 예술 분야에서 영국 명예를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대영제국훈장을 받았다.
그의 작품만큼 유명한 것은 의상이다. 그레이슨 페리는 크로스드레서로 알려졌는데, 터너 상과 훈장을 받을 때도 드레스를 입어 화제가 됐다. 그는 여성 드레스를 입었을 때 자신을 '클레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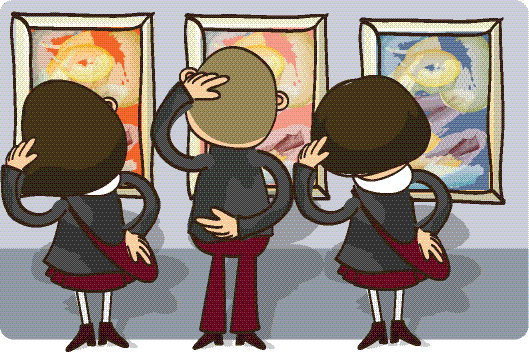
책은 '미술 안내서'라기보다 현역 예술가 그레이스 페리 에세이에 가깝다.
저자는 '사람들이 미술관에 갈 때 떠올릴 만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핑계로 무수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받는 대상은 독자이기도, 예술인이기도, 저자 자신이기도 하다.
26쪽. 책은 마르셀 프루스트 말을 빌려 "우리는 화려하게 장식된 황금색 액자를 통해서 볼 때만 아름다움을 본다"고 한다. 즉,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조건화돼 있으며, 무언가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반복적 노출로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데 익숙해진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주장을 또 비틀어버린다. 그는 다른 실험을 들며 거장 '존 에버렛 밀레이' 작품과 혹평을 받는 미국 화가 '토머스 킨케이드' 작품을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하자, 실험 참가자들에게 거장에 대한 선호가 생겨났다고 했다. '미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저자의 답은 '모르겠다'이다. 사실 이 질문은 애초에 정해진 답이 없고, 답을 찾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질문이다.
이 밖에 '대중으로부터 인기 있는 작품이 수준 높다고 할 수 있는가?', '무척 강렬하고 아름다운 물건이지만 예술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예술일까?', '숲 속에 떨어져 아무도 볼 수 없는 예술 작품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나?', '예술 사진의 기준은 뭔가?' 등….
머리가 하얘지는 이 질문들은 '모든 것'이 예술이 되어버린 동시대 미술에서 더욱더 심화한다.
저자는 '늘어진 가방'처럼 엄청나게 헐렁해진 예술 개념에 불만을 가지고 괴팍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는 예술이 가방이라면 '녹색 싸구려 비닐봉지'라고 투덜대면서도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시인한다.
"우리가 이미 예술의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예술은 이제 끝장났다거나 더 이상 할 게 남아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예술이 될수 있는 것의 경계선을 벗어난 예술작품'이라는 것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112쪽)
미술평론가 로버트 휴즈는 1980년에 이미 "이제 아방가르드는 특정 시대에 속한 양식이 되었다"고 했다. 아방가르드, '앞에서 이끌어 가는 첨단'이란 말조차.
저자는 인터넷 발달로 모든 사람이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예술가가 할 일, 자세를 말한다.
책 첫 장에 새겼듯이 "예술가가 하는 일이란 새로운 클리셰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알아보는 일이 예술가의 일이라는 말이다.

예술가는 모두 조금씩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 또한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내가 만나본 성공한 예술가들은 대부분 대단히 엄격하게 규율 잡힌 사람들이다. 그들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붓는다…그들이 원하는 건 예술가인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만드는 것이다."(175쪽)
저자가 현역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에는 많은 예술인이 공감할 것 같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큰 미술관, 정말 거대한 미술관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거기서 당신에게 전시회를 열자고 제안을 해요…한 1, 2년 후에 내가 그 방을 작품으로 가득 채우면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옵니다. 어쩌면 수천 명이 될지도 몰라요. 언론에서도 와서 보고는 그 전시회에 관해 글을 쓰고 말을 해 대요. 그런 다음 난 그 작품을 팔아야 해요. 내 수입은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어요…거기다 더해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기쁨을 느끼며 그 작품들을 창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전히 재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까?"(177쪽)
예술계를 신랄하게 골려 먹기도, 가열차게 대변하기도 한 저자는 "이 책은 예술계에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끝맺음한다. "내가 뭐라고 조롱한들 위대한 예술은 끄떡도 없이 그 경탄스럽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한다"는 말을 덧붙여서. 미워할 수 없는 그레이슨 페리다운 마무리다.
'미술 안내서'라는 말에 이끌려 책을 집어든 미술 입문자라면 낯설고 복잡한 개념들 탓에 책을 한 번에 읽어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술을 포함한 예술에 관심있는 이들이라면 어렵지만 두 번, 세 번 곱씹어 볼만한 책이다.
원더박스 펴냄. 189쪽. 1만 4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