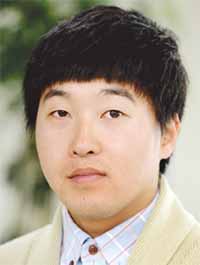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인이 아닌 아이들을 계속 외면해야 할까? 외국인 생모에게 버림받은 무국적 아동 진주 사례와 지난 5월 이주아동에 대한 기획취재를 하면서 피부색으로 국적을 나누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봤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동년 대비 출생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70명 줄었다. 지난해 출생률이 0.98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 2분기도 0.91명으로 나타났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것들은 하나같이 장려금 중심 출생정책뿐이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내집 마련 등을 생각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가 태반일 테다. 단순하게 출생장려금만 쥐여준다고 아이를 낳을 시대가 아닌 것이다.
지난 5월 밀양에서 만난 피부색이 다른 우리네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또래 아이들처럼 떡볶이를 좋아하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가는 부모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돌봄을 포기하고 있다. 무국적 아동이 된 아이들은 보육·의료·교육 서비스 등에서 외면당한 채 어린 나이부터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아이들, 유령과 투명인간으로 취급받는 아이들을 돌보는 한 보육시설은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 키워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고령사회는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떨어지는 출생률을 막기 위해 늦었지만 무국적 아동을 받아들여 사회 구성원으로 환영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