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웬디브라운 지음 이승철 옮김|갈무리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관용할 때 혹은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관용할 때, 전자의 집단은 관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용을 베푸는 그들의 위치는 관용을 필요로 하는 후자의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확보해 준다."
"관용을 베푸는 이들은 관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관용을 받는 이들은 종종 관용의 능력을 결여한 이들로 간주된다. 관용 담론의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권력뿐 아니라 지배와 종속의 문제까지 정당화한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관용의 포용력은 그 자체로 권력의 표현이자 그 권력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이든 개인이든, 강하고 안전한 자들은 관용적일 수 있다. 하지만 주변적이고 안전에서 배제된 자들은 그럴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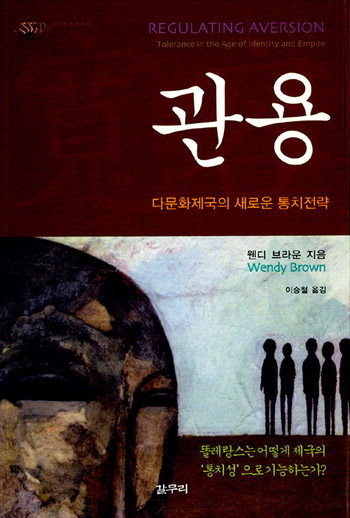
1995년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가 나오면서 지은이 홍세화의 '똘레랑스론'이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공감을 얻게 됐다. 당시-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용이 턱없이 모자랐던 상황에서 '똘레랑스'는 어쩌면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갖춘 이-있는 이들의 교양이 됐다.
여기에서 홍세화가 똘레랑스를 두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 하면서도 모든 것을 관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똘레랑스' 개념이 사회에서 유통되는 수준에서 말하자면, '갖가지 사회 문제들의 원인을 불평등이나 부정의에서 찾기보다는 불관용에서 찾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를테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의 변화나 평등'을 추구하기보다는 '개인 또는 권력의 관용에 대한 호소'에 목매달게 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말로 하자면 "(홍세화의 '똘레랑스' 담론이 당시 막 자리잡고 있었던 새로운 자유주의적 통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했지 싶다는 의심이다.
당시 권력은 김영삼에게 있었다. 김영삼은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와 협력해 그들 권위주의 통치자들로부터 권력을 넘겨 받았다. 김영삼의 권력은, 거칠게 말하자면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사이 그 어디쯤에 있었다.
자유주의가 세력을 넓히려면 지배자가 좀더 많이 피지배자를 품어야 하고, 피지배자는 급진적인 저항을 멈춰야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관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었다, 정도로 풀어볼 수 있겠다.
약자의 말문 막으며 현재 상태 유지하려는 역할 비판
웬디 브라운이라는 미국 여성이 쓰고 이승철이라는 서른 살 청년이 옮긴 <관용 :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은 관용과 불관용만 말하지는 않는다.
관용은, 관용의 철회와 맞붙어 있다. 관용의 철회는 간단하게 이뤄진다. 상대방을,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순간 관용은 철회된다. 말하자면 '저 자식은 인간도 아니야'라며 어떤 한 사람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해 버릴 때가 적절한 보기가 되겠다.

무슬림은 우리 서양의 문명인과 다른 야만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철회'가 정당화되고, 그 결과 갖은 전쟁 행위와 학대 행위가 아름답고 드높은 무엇으로 고양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관용이 지닌 가치를 팽개쳐 버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의 상징인 관용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힌다. 다만, "좀 더 실질적인 권력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하는 각종 불평등과 갈등을, 관용 담론이 어떻게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관리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할 따름이다.
관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책 말미에 붙어 있는 옮긴이의 후기(後記) 제목이 그럴 듯하다. '관용을 넘어 정치로'. '관용 담론' 때문에 탈정치화된 정치를, 원래대로 돌리자는 말인 듯하다. 정치의 본질은 계급 투쟁이 아니던가.
다만, 문장이 번역투의 억지스러움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대목에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갈무리. 344쪽. 1만8000원.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출판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학교와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문화사업(공연··이벤트 제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 생태·역사 부문 취재도 합니다. 전화는 010-2926-3543입니다. 고맙습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