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선경 시선집 배재운 첫 시집
마산에 터전을 두고 활동하는 두 시인이 나란히 시집을 냈다. 2001년 전태일문학상을 받은 배재운이 첫 시집 <맨 얼굴>을, 198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한 성선경이 시선집 <돌아갈 수 없는 숲>을 펴냈다.
두 시인이 눈여겨 보고 나타내는 바는 사뭇 다르다. 성선경은 작품 제목을 보면 자연이라 이를만한 대상이 많고, 배재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가 많다.
두 시집의 표제작 '맨얼굴'과 '돌아갈 수 없는 숲' 전문을 견줘보면 이런 차이는 뚜렷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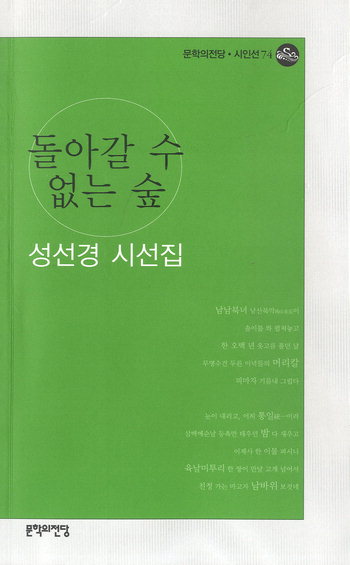 |
||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작은 흉터나
잔주름은 더 또렷해지지만
그래도 말끔한 얼굴이 좋다
젊은 날의 탱탱한
활기찬 모습은 아니라도
조금은 그늘진
살아온 이력이 그대로 붙어 있는
얼굴
맨얼굴이 나는 좋다
-맨 얼굴
이제 돌아갈 수 없네 울울창창
물기에 젖은 이끼들도 햇살을 받으면
지지배배 하늘 높이 종달새가 되던 곳
떡갈나무 잎사귀들도 이슬을 걷으며
삼베적삼 스치는 소리를 낼 수 있던 곳
이제 돌아갈 수 없네 그 그루터기
그늘이 너무 짙어 싫었던 뻐 뻐꾹새 울음소리와
상념의 개미 떼들이 좁쌀로 기어다니던 곳
매미가 울고, 노을이 들고, 연기가 오르면
서너 살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되던 곳
철쭉. 송화가루, 서늘한 안개가 합죽선을 펴던 곳
靑靑靑 이슬방울에도 전설이 자라고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던 곳
이제 돌아갈 수 없네 그 숲
꽝꽝꽝
이제
숲은 없네.
-돌아갈 수 없는 숲
하나씩만 더 들어본다. 짧게 쓰는 배재운에게서는 '걱정 한 그릇'을, 때로는 길게도 쓰는 성선경에게서는 '우린 가포 간다'를 가져왔다.
 |
||
새까만 눈동자가 반짝인다
조금만 더 기다릴까
한 번 해볼까
한참을 망설이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다
처음 하는 두려움
가슴은 콩당콩당
냄비는 달그락 달그락
보글보글 라면 한 그릇
잔업하며 가슴 졸이는
엄마 걱정도 한 그릇"
-걱정한 그릇
(전략) 바다는 한 접시에 다 담길 듯 작아도 이제 여대생이 되었다고 머릴 볶은 스무 살도 군대에 간다고 쌍고래를 떠는 머슴애의 울음도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뻥튀기 같은 얇은 의리도 담배꽁초 같이 나누던 우정도 금세 지워질 낙서 같은 맹세도 다 받아주던 바다
그곳으로부터 봄은 온다고
우린 지금도 가포 간다.
-우린 가포 간다(부분)
문학평론가 김문주는 <돌아갈 수 없는 숲> '해설'에서 "성선경은 생의 비애 아래 있는 자이되, 이 비극성을 다른 존재를 향한 관심과 연민으로 전환하는 '따뜻한 비관주의자'이다" 했다. "그에게 슬픔은 삶을 애틋하게, 사람들을 더 그립게 만드는 힘이 된다. 성선경의 비관주의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덧붙였다.
이응인 시인은 <맨얼굴> '발문'에서 "멋들어진 장식도 그럴 듯한 포장도 없는, 노동자의 일상을 수수하고 담담하게 풀어낸 형의 시가 주는 잔잔한 울림"을 자랑했다.
또 성기각 시인은 "노동이 지닌 소중함이랄까, 생명에 관한 집착이랄까, 그것들을 이만한 서정으로 잡아채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면서 '서정성'에 주목을 했다.
두 시인이 머물고 있는 자리와 눈길을 두는 자리는 이처럼 다르다. 하지만 두 시집을 읽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두드러진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이들 시를 읽으면 따뜻한 그림이 그려지고 사람들 이야기가 풀려나온다는 사실이다. 아주 수월하게.
이밖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면 시집들을 읽어보는 수밖에 없겠다. <돌아갈 수 없는 숲>은 문학의 전당에서 나왔다. 198쪽, 7000원. <맨얼굴>은 갈무리에서 냈다. 120쪽, 7000원.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출판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학교와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문화사업(공연··이벤트 제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 생태·역사 부문 취재도 합니다. 전화는 010-2926-3543입니다. 고맙습니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