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동자의 고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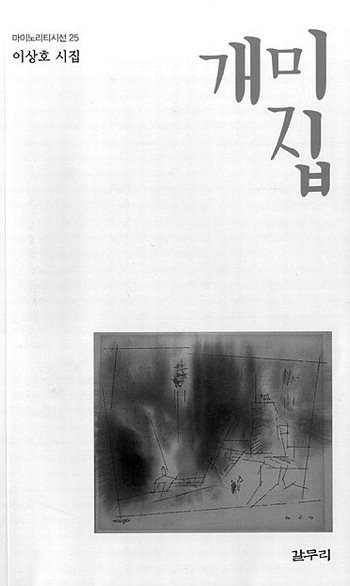 |
||
'일'은 시인이 생존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일' 속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시밭을 일구는 거름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일'로 인해 시인은 '고된 삶의 궤적'을 목도하게 된다.
"집은 무엇 하는 곳이냐고/아내 잔소리/오늘도 이어진다//긴급출동 도맡아 하는 일주일/어제는 회사일 밀려서/아홉시 반 퇴근/오늘은/씻고 밥 먹는데/출동전화다//울산 객지 생활/친구도 친척도 없는 곳/손전화기 들어보이며/멋쩍은 웃음으로 마음달래 보는데//신발을 챙겨 주며/조심해서 다녀오라는 아내/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하다('손전화기 들어보이는데' 전문)"
가난한 시절을 견뎌낸 어머니와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애틋한 시선은 시집 전편에 넘쳐 잔잔한 감동을 준다. 또한 곳곳에 배치된 비정규직과 일용직에 대한 시적 은유는 보는 이의 가슴을 벤다. '일하는 사람'의 시가 갖출 수 있는 미덕이다.
서정홍 시인은 발문에서 "이상호 시인은 이름난 어느 시인처럼 시를 써서 이름을 남기거나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시를 읽고 누군가 '아, 어찌 이리도 내 마음하고 똑 같을까' 하면서 함께 웃고 울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128쪽. 6000원.
임채민 기자
lcm@ido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