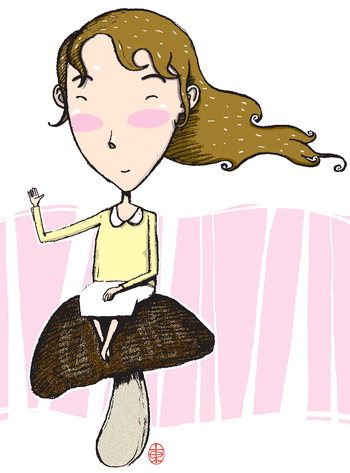 |
||
잘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한번 해먹어 보지도 않았던 표고버섯이건만 그 날만은 요리책을 뒤지지 않아도 요리가 손에 절로 잡혔다. 표고버섯을 따뜻한 물에 불리고 다음날 아침 볶기만 하면 되도록 양파와 당근을 썰어놓았다.
불면증을 앓다 겨우 잠든 여동생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표고버섯을 깨끗하게 씻어 간장과 물, 설탕을 좀 넣고 볶아줘야지' 되뇌고 잠이 들었다.
'표고버섯 볶음'은 여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요리였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동생을 내가 한번 돌봐 보겠노라고 집에 데려오면서 잘하게 된 몇 안 되는 밑반찬이다.
밥상에 자기 숟가락이 하나 더 오르는 것이 미안해 딸아이와 형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만 골라먹던 동생이었다. 그랬던 동생이 버섯요리만은 유난히 욕심을 냈다.
그때부터 간단한 버섯전부터, 버섯간장볶음, 버섯 탕수까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동생이 눈치채지 않게 양을 좀 더 많이 해서 밥상에 올렸다.
요리는 정성이라 했던가. 그 전 만 해도 몸에 좋다기에 요리책을 뒤져가며 만들어도 제 맛이 나지 않던 버섯요리가 그제서야 버섯 고유의 향과 색, 빛깔을 머금은 반찬이 돼 가는 듯 했다.
동생이 이 세상을 떠난 지 50여 일이 지났다. 그때와 똑같은 재료를 써도 그때 그 맛이 나지 않았다. "언니가 이런 요리도 할 수 있었어, 너무 맛있다. 이거 나 다 먹어도 돼?"라며 동생이 말을 건넬 때, 내 입가에 맴돌던 새콤달콤한 맛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요리가 맛있던 것이 아니라 고인은 나의 서툰 요리를 참 맛있게 먹어줬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박종순 기자
yard@idomin.com

